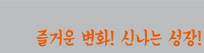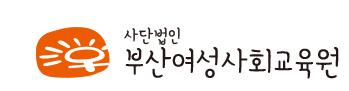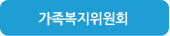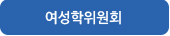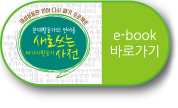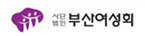일다 - ‘창녀’에 대한 김기덕의 집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06 08:30 조회1,548회 댓글0건본문
‘그 작가주의’를 벗긴다
‘창녀’에 대한 김기덕의 집착
김윤은미 기자
2004-03-08 00:31:02
결국은 중단된 이승연의 ‘위안부 누드’. 원래 계획된 누드집의 줄거리는 1차 소재가 ‘위안부’이고, 2차가 ‘게이샤’이며 3차가 ‘사원’이라고 했다. ‘타락한’ 몸을 성스러운 장소에서 승화한다는 의미다. 누드집의 줄거리를 본 순간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김기덕 감독이 이승연씨에게 ‘러브콜’을 보냈다는 기사를 접했을 때, 그 줄거리가 바로 김기덕 감독의 영화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폭력에 노출된 여성의 성에 ‘타락’과 ‘성스러움’을 동시에 배치해, ‘창녀’이자 ‘성녀’로서 여성이 자신을 포기하고 상대 남성을 구원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 그의 영화가 주로 다루는 내용 아닌가.
남성 욕망의 핵심을 다룬다
사실 여성의 몸이 영화에서 온전하게 다루어진 적은 거의 없다. 특히 남성관객을 겨냥한 장르 영화에서 여성의 존재란 남성의 욕망을 반영하는 인물일 뿐이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가 유독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장르적인 관습과는 다르다. 그의 영화는 보는 관객들을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그 불편함은 질에 낚시 바늘을 넣는 등 일련의 자극적이고 강렬한 이미지 때문이 아니다.
그의 영화는 남성 욕망의 핵심을 정면으로 다룬다. 그의 영화에서 남성 캐릭터들은 여성의 몸에 ‘창녀’라고 낙인 찍어 성적 욕망을 분출하고 폭력을 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성녀’라고 표기함으로써 자신의 죄의식을 씻어버리고 ‘구원’되기를 원한다. 문제는 그가 만든 영화적 세계가 여성과 남성의 비대칭적인 권력구조를 가린 채, 남성 개인의 ‘구원’ 문제를 집요하게 다룸으로써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여성의 성적 희생을 신비화한다는 것이다.
<겨울여자> 이화와 <사마리아> 재영
여성의 몸에는 남성의 욕망이 다양하게 투사된다. 김영옥은 ‘소수 집단 문학으로서의 여성 문학과 그 정치학’(<근대, 여성이 가지 않은 길>, 또하나의문화)에서 1970-1980년대 영화에서 대중성을 획득한 여자들의 유형을 분석한다. 그 여성상들은 ‘영자/경아/이화’라는 세 인물로 요약된다.
‘영자’는 시골에서 짐 싸 들고 돈 벌기 위해 상경한 순진한 소녀가, 공장에서 일하거나 가정부로 일하다 주인집 남자들에게 강간당한 후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다 결국 술집여자로 정착하는 서사를 담고 있다. 두 번째로 ‘경아’는 천진난만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에게 계속 배신 당한 후 알코올 중독자로 생을 마감하는 여성이다. ‘경아’의 ‘통통하고 작은 몸’은 그녀를 소유했다 버리는 남성들의 욕망을 잘 충족시킨다.
‘이화’는 남성 지식인의 내면이 투영되는 존재로서, 어떤 남자와의 관계에서도 쾌락을 느끼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을 깊게 연민할 뿐이다. 이처럼 어디서 들어본 듯 한 진부한 여성상들은 모두 파괴적으로 개인을 압박했던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폭력적인 사회의 단면과 일그러진 남성들의 내면을 투영한다. 그녀들은 남성들의 판타지 속에 존재하는 여성들이다.
이 같은 진부한 여성상은 김기덕의 영화 속 여성인물들과 일정부분 겹친다. 즉 ‘경아들’과 <나쁜 남자>의 선화, <사마리아>의 재영 모두 ‘성적 희생’과 ‘타락’이 여성 자신의 의지, 욕망과는 상관없이 당대 남성의 욕망/판타지를 위해 강조되는 인물들이다. 물론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김기덕 감독의 여성들의 몸에는 시대의 그늘-근대화 과정의 폭력성-이 투사되지는 않는다. 대신 ‘가진 것 없는’ 하류계급 남성, 혹은 ‘욕망해서는 안 되는’ 아버지의 감성이 투사된다.
이를테면 이전 영화들이 여성들의 ‘기구한 운명’을 통해 시대의 그늘을 눈물로 호소했다면, 김기덕 감독은 그 뒤에 가려졌던 남성의 욕망을 전면에 내세운다. 그의 영화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사회 관습과 윤리의 측면에서 남성들이 욕망해서는 안 되는 존재다. 김기덕 감독은 억눌린 남성 주인공들로 하여금 이 설정을 부수게 한다. 사랑하는 여자를 ‘창녀’로 만들고 싶은 욕망, 딸을 감히 욕망하는 아버지의 욕망은 ‘젠틀한’ 남성들의 사회적 윤리 뒤편에 존재하는 말초적인 남성들의 욕망을 정확히 건드린다.
그렇다면 윤리의 위반에서 오는 죄의식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죄의식은 엉뚱하게도 상대 여성을 통해 구원된다. 그녀들은 남성들을 보듬어 안고, 위로해준다. 이제 영화는 절망 속에서 구원을 찾는 개인 남성과 여성의 문제로 변모하며, 여성들이 당하는 강간과 성매매는 구원이라는 종교적 의미를 상징한다.
가부장적 여성상, 창녀/성녀 이분법
그렇다면 애초에 욕망해서는 안 될, ‘딸’ 혹은 ‘성녀’와 같은 존재로 여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